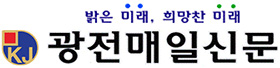저장문화가 발달 되지 않았을 때는 산야에 있는 열매 등도 많이 따놓을 필요가 없었다. 물속에서 자라는 고기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수렵했다. 때문에 늘 자연이 풍부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역시 마찬가지다. 탐욕스런 백인들이 총 들고 들어와 살육전을 벌이며 땅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평온했다. 개인 소유의 땅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게 풍부했다. 저녁 찬거리가 필요하면 전사 한 두 명이 나가 화살로 적당한 짐승 한 마리 잡아 오면 끝이었다. 그래서 영혼이 맑았다. 모든 산하가 아름다운 정령으로 그득 찼다.
우리네 시골도 마찬가지였다. 문명의 찌꺼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십시일반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 이에는 혈족 여부도 가리지 않았다. 지나가던 거지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극빈자나 거지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일, 제삿날까지 알고 지냈다.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도. 때로는 음식 장만하는 기척이 없으면 알려주기까지 했다. 비록 물질적 풍요는 지금과 같지 않더라도 정신적 풍요는 훨씬 더 컸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모두가 아우성이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을 봐라. 인간의 꼴이 아니다. 마치 아귀들의 난장판 같다. 겉으로는 번드르한 말을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뺀질거리는 꼴은 기름 장사 손가락 같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기야 그런 양심 있으면 그러겠는가. 아무리 재물을, 권력을 많이 가져도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감돌지 않는다. 무한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다. 사실 고통은 꼭 필요하다.
허리에 극한 통증이 온다고 강력한 진통제만 쓸 수 있는가.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허리가 망가져 버릴 것이다.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면 함부로 허리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자께서는 어딘가가 좋지 않으면 통증이라는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빨리 알아차려서 적절한 대처를 하라고.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없으면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갈증 욕구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수시로 물을 먹여주듯이. 원하는 권력을, 재물을 보다 많이 못 가졌다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고통이 주는 의미를.
편집국 gwangmae5678@hanmail.net
 2025.05.11 06:37
2025.05.11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