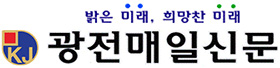|
기묘사화가 일어나던 날 저녁 무렵 사관(史官) 채세영(蔡世英)이 모함 소식을 접하고 궁궐로 달려갔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에게 사건을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 남곤(南袞)에게 물으니 대답을 얼버무렸다. 정광필은 채세영에게 본 대로만 기록하라고만 강요했다. 훈구파 김근사(金謹思)는 영의정 곁에 있다가 사화에 연루된 선비들의 죄목을 고쳐 쓰려고 사관 채세영의 붓을 낚아챘다. 채세영은 무모한 행동에 참을 수 없어, 급히 일어나 김근사가 빼앗아 간 붓을 다시 빼앗으며 말했다.
"이 붓은 사관만이 쓸 수 있는 붓"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그는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臣)은 간관(諫官)이 아니오니 함부로 말하면 죄가 됩니다. 전하! 조광조(趙光祖) 등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의 죄명을 듣고 싶습니다."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그 서슬에 주눅이 들어 모두 목이 움츠러들었다.
이런 사건이 조정 내외에 소문이 퍼지자, 길을 가던 사람이 "저 사관이 임금 앞에서 붓을 빼앗은 분이다"라고 했다.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일개 사관이 분연히 일어나 불의 앞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똑똑히 보여줬다.
이런 불행한 역사적 사실을 간파한 조선 후학들은 "奪筆公(탈필공)"이라는 글을 지어 여러 문집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奪筆公(탈필공) 붓을 빼앗은 공
(前略)
賢如趙公可使誣(현여조공가사무) 조공같이 어진 분은 무함할 수 있겠지만
直如蔡公誰能屈(직여채공수능굴) 채 공같이 강직한 분을 누가 능히 꺾으랴
我筆我持自不書(아필아지자불서) 내 붓을 내가 잡고 스스로 쓰지 않는데
爾手欲下神明怒(이수욕하신명노) 네 손으로 쓴다면 신명이 노하시리라
雷驚電掣克奪還(뇌경전체극탈환) 우레처럼 번개처럼 당겨 도로 빼앗으니
壯氣直上凌寰宇(장기직상능환우) 장한 기상 곧장 솟아 하늘을 찔렀도다
(後略)
위 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관 채세영은 임금 앞에서 희생을 감수하고서 김근수에게 빼앗긴 붓을 다시 낚아채어 사관의 임무를 수행한 강직한 신하이다.
이 당시 이조 정랑이었던 유감(柳堪), 황해도 관찰사 역임한 민기문(閔起文) 등이 말하기를 "세상에 인물은 오직 채세영 한 사람뿐이구나!"라고 하였다. 공은 이러한 지조 때문에 은둔생활 하다가 몇 년 후에 등용되었으나 불의에 영합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난세(亂世)라고 이야기한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이 좋았구나!' 하면서도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 독선에 빠진 대통령이나 부화뇌동하는 측근들은 언제나 있었다.
얼마 전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여당 김웅 의원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가 찬성표 던진 이유는 "젊은이가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던 사람을 항명 수괴죄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며 정치적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결정에 존경받았다.
언론을 틀어막고 시녀가 될 것을 강요해도, 그 앞에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직언하고 행동하는 위정자,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가야 국가의 정도(正道)가 바로 선다. 임금 앞에서도 불의에 참지 못하는 사관 채세영! 국힘당 내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원칙을 지킨 김웅 의원 같은 소신파가 많아야 좋은 국회의 모습, 국가 미래의 모습도 융성하리라 확신한다.
▲AU사이버대학 전)교수
이동환교수
이동환 교수 gwangmae5678@hanmail.net
 2025.05.15 20:55
2025.05.15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