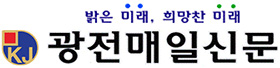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 담론에도 불구하고 '웰 다잉'이라는 말은 급격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 자체가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사망.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란 말이다.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신심이 두터운 신앙인이든지 뭔가를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괴테는 임종을 맞이하면서 모인 가족들에게 "빛을 더"라는 단어를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뜨락의 잔디밭으로 밀고 나갔다. 거기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는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은 아니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바 최고의 작가요 철학자였다. 각설하고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웰 다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식문화가 개선되어도 건강연령까지 크게 연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70대 후반이 넘어가면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거기에다 가족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각종 부정적인 현상도 도출된다. 1인 노인가구도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죽음을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치루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부터 노인들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60대 후반부터는 죽음 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건강 체크도 자주하면서 고독사도 예방해야 한다. 살아온 기간 동안의 삶을 기록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연장치료 거부 등도 또한 필요하다. 자살예방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4월 현재는 13.8%다. 2018년도인 내년에는 14.3%가 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될 예정이다. 통계청의 추계치가 그렇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초스피드다. 이 와중에 발생되는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노인의 자살문제다. 노인 자살시도의 1순위는 본인의 질병(35.9%), 2순위는 우울증(19.6%) 그리고 3순위는 자녀와의 갈등(9.8%)이다. 즉, 노인 자살시도자 3명중 1명은 본인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노인은 여러모로 상실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제적 상실, 건강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상실, 보람의 상실 등.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잘 갈무리하지 못하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웰 다잉 대처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인,사회복지학 박사
임성욱 박사
임성욱 박사 gwangmae5678@hanmail.net
 2025.05.10 22:08
2025.05.10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