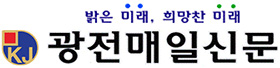|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의 범위 내에서 삶의 여행을 하는 것이다. 수많은 '우연'이라는 호수를 만나가면서.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처음부터 필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주 만나면서 상호 간에 매력을 느끼는 부분을 공유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전되어가면서 사랑으로 전환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 사무적이라 할 정도로 정적인 현상이 전혀 없는 만남이라면 사랑의 샘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너였다가/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다시 문이 닫힌다.」 이 얼마나 애절한 기다림인가. 이러한 애절함이 인간사를 정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고도의 문명화가 진행되어가는 오늘날은 황지우 시인의 시와 같은 애절함은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다. 나날이 깊어만 가는 물질주의가 인간의 정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곧 극도의 개인이기주의로 발전하면서 피차간에 메마른 공간을 넓혀가기 때문이 아닐까.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판을 봐보라. 상호 간에 상대방을 죽이고 죽어가는 상황이지 않은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더더욱 이런 각박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 같다. 이 정부가 뚜렷하게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라곤 몇 가지 법률 지식뿐인가. 그것도 가까이는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좀 더 확장하자면 아류들을 위한 알량한 법조문 잔치인가. 유사 이래로 법조문 몇 개에 의지한 정치 행위는 언제나 천민 의식이 그득했다. 때문에 사랑이 없는 각박한 사회로 변모되어 버리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과 서양철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Saint Augustine,354-430)는 "희망은 선한 것, 미래에 있는 것,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과 관련될 뿐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희망은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희망은 더이상 희망으로 존재하지 않고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랑은 끝이 없지만, 희망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살이에 국한된다고 했다. 그래서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희망을 키워주되 희망의 과실을 따 먹게 되는 부류들은 그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 과실을 특정인이 획득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면 어떨까. 만약 그런 시늉이라도 한다면 청사에 길이 빛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시인,사회복지학 박사
임성욱 박사
임성욱 박사 gwangmae5678@hanmail.net
 2025.05.11 08:54
2025.05.11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