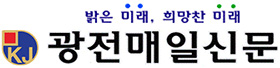|
'서울의 봄'을 생각하면 연상된 것이 '프라하의 봄'이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둡체크' 서기장이 통치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기조 아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다당제와 자유 총선을 천명하는 등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자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둡체크'의 민주적 통치행위를 반대한다며 1968년 8월에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했다. 시민들이 수도 프라하로 공격해 오는 적 탱크를 막은 과정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였고 '둡체크'를 모스크바로 끌려가 탄압받았다. 이렇게 '프라하'의 봄은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겨울로 돌아갔다.
그런데 1968년 필립카우프먼 감독이 제작한 '프라하 봄(171분)' 영화는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각색하여 만든 작품이다. 소련군 침공 무대에서 벌어진 러브 라인(love line) 내용과 정치 혼란 속에서 주인공의 예술과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고독한 죽음으로 클라막스 장식하는 장르이다. 우리나라 '서울의 봄'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서울의 봄'은 10.26 박정희 대통령의 급서거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특히 군 사조직인 하나회는 우두머리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 강경 진압했다.
이에 '서울의 봄'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낳았고, 전두환이 투입한 공수부대가 자국민에게 무자비한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 160명의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종결되었다. 이로써 '서울 민주화의 봄'은 국민의 염원이었으나 결국 다시 겨울로 돌아가 자연의 순리를 거역했다.
김성수 감독이 제작한 '서울의 봄(141분)'은 10.26일에서 12.12까지, 억지 신파(新派) 없이, 러브 라인도 가미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모티브로 삼았다. 군부가 권력 찬탈 과정을 배우자들이 수준 높은 연기로 생생하게 연출하여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감정이입에 최고의 영화라는 관객들의 극찬이 쏟아졌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과 '서울의 봄'의 영화 공통점은 불의(不義)가 정의(正義)를 이겼다는 데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이다. 악(惡)이 파죽지세로 잡은 권력 앞에 참군인과 참시민이 지향하는 선(善)이 무너진 현실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강자가 정의 실현에 앞장설 때 국민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권력자가 정의를 말살하면 얼어버린 사회가 된다. 경제침체, 양극화, 이념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사회가 된다. 아이러니컬하게 역사에 나타난 강자는 다수가 정의롭지 못했다. 정의는 인류공영의 가치이므로 정의는 반듯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 두 영화의 메시지를 잘 새겼으면 한다. 얼마 남지 않는 총선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 색깔로 보지 말고, 좌·우파 이념의 프레임에 벗어나 역사적 관점에서 근현대사 인식을 새롭게 다져, 다시는 이 땅에 불의의 권력자가 출현해서는 안 된다.
역사 기록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생생하게 재현한 '서울의 봄'의 영화가 왠지 윤석열 정권과 비교할수록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같다는 생각이 든다.
▲AU사이버대학 전)교수
이동환교수
이동환교수 gwangmae5678@hanmail.net
 2025.05.16 18:47
2025.05.16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