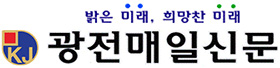|
하지만 바다 위는 오래전부터 직접 오갔다. 그래서 하늘만큼 신성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주로 하늘을 중심으로 한 각종 종교가 탄생 된 것이 아닐까. 최고의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만큼 하늘은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 삿대질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하늘은 두려움의 존재이자 믿음의 대상이고 미지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희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하늘을 날고 싶어 한지도 모른다.
결국 진화를 거듭한 끝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고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리는 세상이 되었다.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하늘에 대한 신비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 통상 오늘날을 우주산업 개척 경쟁의 시대라 할 정도로 하늘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일론 모스크는 이미 화성개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앙리 마티스(Henri Émile-Benoît Matisse. 프랑스 1869~1954)는 예술과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재즈 Jazz〉(1947)를 출판하면서 화려한 색채 삽화를 곁들였다. 이때 사용된 기법이 종이 콜라주다.
마티스는 이를 "가위로 그린 소묘"라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건강 악화로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색깔 자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 탄생한 삽화가 이카루스(Icarus,1947)다. 그리스 신화 속 명장(名匠) 다이달로스(Daedalus)는 미노스 왕의 총애를 잃고 감옥에 갇혔다가 밀랍과 깃털로 날개를 만들어 아들인 이카루스와 함께 시칠리아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카루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날개가 녹아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 여기에서 피카소나 샤갈 같은 화가들은 바다에 빠지거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주로 그렸다. 하지만 앙리 마티스는 강렬한 원색에 춤을 추는 듯한 색다른 모습의 이카루스를 그렸다. 그야말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 보자"는 소원을 담은 모습을. 예술은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무겁고 살벌한 억압이 심한 사회일수록 명시적 표현보다는 잠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유럽 인권 조약 제10조 등에 모두 표현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표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느 한 극히 짧은 권력이 결코 억눌러서 불태워버릴 수는 없단 말이다. 들판에 말라비틀어져 널부러진 풀들은 아무리 태우고 또 태워도 그다음 해 봄에는 더더욱 왕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시간의 흐름은 하늘의 비밀까지도 밝혀버렸다.
하물며 좁쌀만도 못한 인간들의 고만고만한 작태들을 밝히지 못하겠는가. 제발 만용을 부리다가 이카루스 꼴이 되지 마라. 혹시 앙리 마티스는 어떻게든지 비상해서 비루한 비밀들을 밝혀내라고 자꾸만 날아다녀 보자는 콜라주 작업을 그리도 강행 했을까.
▲시인, 사회복지학박사
임성욱 박사
임성욱 박사 gwangmae5678@hanmail.net
 2025.05.16 23:55
2025.05.16 23:55